어쩌다 대가족, 오늘만은 무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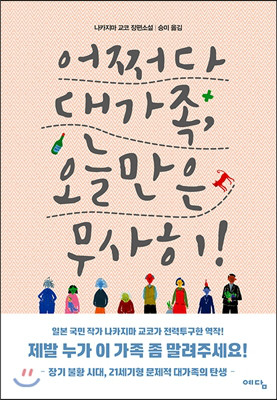
2013년에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2010년에 출간한 같은 제목의 천명관 장편소설을 영화화 한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사를 다룬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령화 가족>의 가족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49세. 모두들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출가를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모여들어 함께 살게 된다. 인간쓰레기 첫째부터 사업을 말아먹은 둘째 그리고 바람기를 주체할 수 없는 셋째까지 누구 하나 정상적인 인물이 없는 이 가족 구성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족이라는 무작정 끌어 안을수도 무작정 피할 수도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자그만 사회의 단면을 가감없이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본의 국민 작가라 불리우는 나키지마 쿄코의 최신작 <어쩌다 대가족, 오늘만은 무사히!>를 보고 있자니 고령화 가족이 생각났다. 물론 쿄코의 최신작은 고령화 가족 만큼이나 막장은 아니지만,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부모님의 집에 들이닥쳐 살게되고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두 작품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웃한 나라에서 비슷한 작품이 나오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21세기형 가족
현대사회는 별의 별 이름을 단 각종 질병이 난무하고 있다. 바이러스야 그렇다 치더라도 딩크족, 코쿤족, 히키코모리니 하는 무슨무슨 종족들과 중2병, 여성혐오증, 공황장애등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각종 증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식량 부족으로 보릿고개니 하면서 먹거리 걱정이 유일한 사회적 문제였던 것에 반해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배부른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쇠태의 길로 접어들면서 양극화와 그에 따른 갈등과 불만들이 현대 사회를 더 삭막하게 만들고 있으니 어쩌면 인류는 세계전쟁 이후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기초사회도 멀쩡할리가 없다. 핵가족화를 넘어 1인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필요에 의헤서만 얼굴을 마주할 뿐 더 이상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 한 집안에 살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닌것은 아닌가?

경기불황 시대의 마지노선
21세기형 가족의 모습은 이렇듯 가족이라 할 만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부양자 노릇을 하면 책임을 다 했다 싶고 자식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대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족간의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더 가늘어 이제는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서구화된 생활양식이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해 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도 요즘 부쩍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인데, 맞벌이 부부들이 본인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와 다시 합치는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부모님의 도움일 것이다. 물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물론 두 소설의 주인공들 처럼 처음부터 출가할 의지를 갖지 못했거나 결혼, 사업의 실패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에도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도 가족, 가족, 가족
고령화 가족이나 어쩌다 대가족, 오늘만은 무사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의 발단, 경과 흐름을 보면 어찌 되었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가족의 참된 의미는 아직 완전히 희석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편안함 낯익음에서 불편한 낯설음으로 그리고 다시 편안한 낯익음으로 바뀌기 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구성원들의 노력을 버무리면 분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각각의 지붕이 무너져도 다시 한 지붕아래서 튼튼히 자신의 버팀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공간이며 그 공간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y Life >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 (0) | 2016.07.01 |
|---|---|
|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당구 (0) | 2016.06.27 |
| たのしい (楽しい): 타노시이 (즐겁다) (0) | 2016.06.27 |
| 언제 어디서든 별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 (0) | 2016.06.23 |
| 재테크 보다 재대로된 재무설계를 먼저 하자 (0) | 2016.06.20 |




 인고의 시간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구성원들의 노력을 버무리면 분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인고의 시간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구성원들의 노력을 버무리면 분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